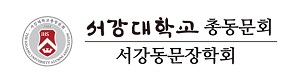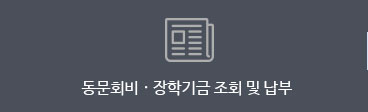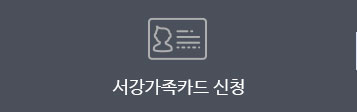[특별기획] 세계명문 가톨릭대 탐방 ① 벨기에 루뱅대학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3-14 15:47 조회26,24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서강옛집>은 명문으로 손꼽히는 세계 가톨릭 대학과 예수회 대학을 살펴보는 시리즈를 마련했다. 가톨릭 예수회 전통을 근간으로 하는 모교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리즈를 통해 만나게 될 대학들은 오늘의 서강을 비춰보는 거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거울을 통해 서강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첫 번째로 벨기에 루뱅대학교를 살펴본다. 서동욱(90 철학) 모교 철학과 교수는 1996년부터 2002년까지 가톨릭 명문 루뱅대학교에서 공부하며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편집자>
대학원 과정을 마쳐 갈 때쯤 장차 내가 공부하려고 마음먹은 유럽의 대학을 자주 떠올리고 있었다. 가보지 못한 먼 도시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프루스트처럼 이름을 가지고 꿈꾸기를 멈추지 않는다. 루뱅의 이름을 발음하고 떠올릴 때마다 나는 품격을 가진 오래된 도서관의 높고 아름다운 천장을 떠올렸다. 물론 세월을 견디고 살아남은 장서들과 유럽 철학의 오랜 역사도 함께 말이다. 그 후 매혹과 더불어, 또는 대학의 놀랍도록 까다로운 시험에 대한 지긋지긋한 감정과 더불어 젊은 시절을 이 도시에서 보내면서도, 인간 정신의 높이를 재려는 듯 높이 솟구친 저 아름다운 천장의 이미지는 늘 마음 한 구석에 머물렀다.
나치 위협 맞서 ‘후설 철학’ 지켜
루뱅과 관련해 나를 가장 사로잡았던 것은 ‘후설문서보관소’였다. 그 기관은 철학적인 관심을 넘어서, 유럽현대사의 한 극적인 단면과 학문에 대한 보편적 열정의 상징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독일의 철학자 후설(Husserl, Edmund)은 유대인이었는데, 그는 속기로 글을 써가면서 사유를 전개한 사람이다. 그래서 1938년 후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약 4만 5000장의 속기원고와 1만 장의 타이프 원고가 남았다.
그리고 이내 그 방대한 문서들 전체가 유대인저서 말살운동으로 불살라질 위험에 처했다. 당시 루뱅 대학의 철학도인 반브레다 신부가 나섰다. 그는 유족들을 설득한 후 루뱅 대학 당국과 협의해 나치의 눈길을 피해 후설의 유고 전부와 그의 서재 전체를 대학으로 옮길 계획을 세웠다. 이 진귀한 이삿짐을 실은 기나긴 열차의 행렬이 벨기에의 북쪽 도시로 이어졌다. 그렇게 해서 루뱅에 후설문서보관소가 들어서게 된다.
분서갱유의 위험에 처한 철학의 보물, 이를 구하고자 하는 학자의 열렬한 마음, 순수 학문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대학이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매우 극적이며 어딘가 아름다운 신화를 닮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다. 신화가 한 민족의 마음의 거울이라면, 저 이야기는 유럽인의 마음의 모든 것, 즉 전쟁과 민족 증오와 학문에 대한 고매한 취향 전부를 한꺼번에 비추어주는 신화였다. 그리고 신화의 중심에 유럽 정신을 표현하는 이 오래된 대학이 있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남아있던 세계 유일의 아이스킬로스 희곡 전집을 불사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죽은 유대인의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 도서관을 세우는 이들도 있는 것이다. 그런 모습으로 루뱅은 순수 학문의 빛나는 성좌로 오르는 하늘의 사다리처럼 한 젊은 연구자의 마음 안에 들어섰다.
문서보관소 설립 이후 메를로퐁티를 비롯한 많은 현대 철학자들이 루뱅에 와서 이 문서들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며, 이제까지 루뱅은 현대 유럽 철학의 움직임에 가장 민감한 장소로 자리 잡는다. 내 개인적인 생각엔, 세계 어느 곳보다도 빨리 현대 유럽 철학의 조류를 교육 커리큘럼 안에 수용하고 연구하는 곳이 루뱅 대학이다.
루뱅은 그 공식 명칭(Catholic University of Leuven)이 알려주듯이 가톨릭 대학으로 출발했다. 1425년에 교황 마르티노 5세가 이 대학을 세웠다. 1366년, 오늘날 스텔라 맥주를 생산하는 인터부르사 최초의 양조장이 이 도시를 본거지로 탄생한 지 60년 후의 일이다. 인간이 목말라 하는 두 가지, 최고의 지식과 맥주가 이 도시로부터 흘러넘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긴 역사가 알려주듯 루뱅이라는 대학과 도시는 공간적인 면에서도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도시 전체에 전문 영역별로 대학이 흩어져 있으며, 학문의 종류별로 여기저기 들어서 있는 크고 작은 도서관이 100개가 넘는다. 카페와 대학이 함께 있는 곳, 운하 옆의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후 곧바로 강의실로 갈 수 있는 곳, 중앙도서관 앞의 광장이 금요일이면 재래시장으로 사용되는 곳이 루뱅이다.
도시가 곧 대학, 도서관 100개 인프라
저지(低地)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부유럽 최대의 대학이란 영예를 루뱅은 오래도록 누려왔다. 그 영예엔 유럽의 가장 중요한 이름들이 함께 했다. 16세기엔『우신예찬』으로 유명한 에라스무스가 루뱅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 등을 가르치는 단과 대학을 세웠다. 또한 신성로마제국 황제 카를 5세의 선생이었으며 후에 교황 하드리아노 6세로 즉위하는 아드리안 카디날 플로렌즈가 교황이 되어 로마로 떠나기 전까지 루뱅에서 교수 생활을 했다. (하드리아노 6세는 500년 뒤 요한 바오로 2세가 즉위하기 전까지는 마지막 비(非)이탈리아인 교황이었다.)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겜마 프리시우스는 루뱅 대학에서 근대 과학의 초석을 다졌다. 1542년에 그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대해, 코페르니쿠스가 별들의 운동과 운동 주기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 모두를 정확하게 계산해 낼 수만 있다면, 그가 지구가 움직인다고 주장했는지, 움직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는지,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매우 근대적이며 합리적인 주장을 편 사람이다.
이 외에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익숙한 메르카토르, 해부학의 아버지 베살리우스 등등이 루뱅에서 가르쳤다. 루뱅은 17세기와 18세기에 가톨릭 지식인을 위한 중요한 트레이닝 센터였고, 19세기엔 교황 레오 8세에 의해 토미즘 철학의 중심지로 발전했다. (잠깐 지나가며 말하자면, 루뱅은 가톨릭 대학이라는 오랜 명칭을 가지고 있으나, 재정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오늘날 가톨릭에서는 독립해 있다.)
현대에 와서도 철학, 신학, 법학 등 유럽의 전통 학문을 대표하는 영역은 계속 최고 명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유럽 최대의 전자, 생물공학 연구소인 아이맥(iMac)이다. 아이맥은 인류의 차세대를 목표로 한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연구소인데, 가령 첨단 의료 장치를 생활 속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연구 및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법 등에 몰두하는 기관이다. 아이맥의 장점은 세계의 많은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쉽게 파악하고서 완성도 높은 기술을 만들어 가는 데 있다. 삼성, 인텔, 소니, 퀼컴 등의 회사가 이 연구소와 제휴 중이며 이 회사에선 루뱅으로 끊임없이 연구원을 파견하고 있다.
루뱅 대학은 1970년대 벨기에의 정치적 변화, 쉽게 말해 북쪽의 네덜란드어 사용 지역과 남쪽의 불어 사용 지역이 자치적인 성격을 띠면서 두 개의 쌍둥이 대학처럼 되었다. 예전부터 원래 있던 대학은 네덜란드어권인 북쪽의 대학이 되고, 프랑스어권인 남쪽에 새로운 루뱅 대학이 세워진 것이다.(그래서 북쪽에선 주로 네덜란드어와 영어로, 남쪽에선 불어로 교육한다.) ‘가톨릭 루뱅 대학’의 양쪽 지역 언어 표기에 따라 북쪽은 KUL(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로, 남쪽은 UCL(Universite catholique de Louvain)로 불린다. UCL은 모교와도 인연을 맺고 있다. 2007년 UCL의 로만어학부와 서강대학교 문학부 간에 교류협정을 체결한 후 지속적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지금도 모교 프랑스문화학과 학생들이 매년 파견되고 있다.
“나도 모르겠다”의 힘, 허명을 없애다
루뱅의 학문과 교육 이념은 전통적인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가장 빨리 현대화되려는 노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17세기 유럽의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저지 지방의 학문과 전통적인 중세적 유산은 권위와 나태 속에 안주하여 비웃음을 자아내는 허명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현대적 학문의 흐름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기고 자기 발전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루뱅에서 공부하면서 인상 깊었던 교수의 말은 놀랍게도 “나는 모르겠다”는 말이다. 선생이 모른다니! 그러나 수사(修辭)도 허세도 없는, 오로지 논리와 문헌에 대한 지식만 지배하는 학문 세계 안에선, 확실성을 가지고 다가서지 못하는 영역 앞에선 속절없이 “모르겠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은 역설적이게도, 확실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자기 영역 안에서의 자긍심과 엄밀함, 그리고 그 확실한 영역이 장차 널리 퍼져 모르는 영역이 사라지게 되리라는 자신감을 표현해주고 있었다. 인간이라는 작은 바닷가는 모르는 것 투성이의 대양(大洋) 옆에 잠깐 하얗게 머리를 드러내는 아주 확실한 모래톱인 것이다. 지식의 배후에는 겸손한 무지가 있으며, 루뱅의 학생과 교수 모두는 그 무지를 100년에 1밀리미터 줄이려고 중노동을 했던 것 같다. 그것은 여가와 취미가 없는세계이고, 보상보다는 신념에 의해 꾸며진 세계이며, 지식과 인류의 미래를 노려보는 오래된 대학의 시선이었다. 
서동욱(90 철학)
서강옛집 편집위원, 모교 철학과 교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