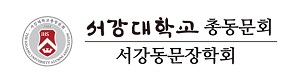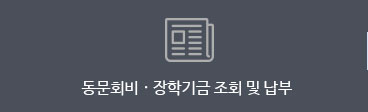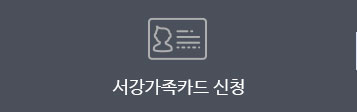“소통 부족 대한민국에 신선함 불어넣으렵니다” - 한국소통학회장 취임 김성호(67 국문) 동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9-05 21:55 조회26,53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1
“미정아, 잘 있냐? 방학 안 끝났니?”
“어머, 교수님 안녕하세요.”
무더운 8월 어느 날, 신촌의 민속주점에서 모교 재학생과 마주친 김성호(67 국문) 동문은 아는 얼굴을 마주치자 대뜸 이름부터 부른다. 외부 강사로서 커뮤니케이션학부와 언론대학원에서 김 동문이 가르친 제자다. 동동주 안주로 나온 파전을 찢던 제자는 대선배이자 강사가 어떻게 자기 이름을 기억하는 지 의아해 하면서도 무척 반긴다.
#2
‘성호형 보시오’란 인사말로 써내려간 엽서는 이공규(68 경제) 동문이 학창 시절 부산으로 여행 갔을 때 부쳐왔다. 4원짜리 엽서의 발신일이 1969년 8월 5일이다. 아무 연락 없이 떠나온 것을 이해해달라며 서울에서 보자는 당부가 실렸다. 원용진(76 신방) 모교 신방과 교수는 1991년 미국 대학에서 박사 학위 논문을 완성하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왔다. 평소 김 동문으로부터 도움 받은 데 대한 감사 인사가 꾹꾹 담겼다.
1970년 한국방송공사(KBS)에 서강인 최초로 입사해 36년 6개월 동안 방송 한길을 걸어온 김성호 동문이 지난 6월 제 8대 한국소통학회장에 취임했다. 한국소통학회는 신문방송, 국어, 스피치 교육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하는 모임이다. KBS에 서 아나운서와 원주방송국장을 거쳐 기획단장과 KBSi 대표이사까지 거친 김 동문은 ‘소통’이 부족한 대한민국에 신선함을 불어넣을 태세다. 첫 대면하는 누구에게서라도 30분이면 호감을 살 정도로 소탈한 김 동문의 성품이 가져온 책임이자 명예다.
사례로 든 첫 번째 장면(#1)은 김 동문이 지닌 소통의 자세가 발휘된 성과다. 2000년 이후부터 서울대, 가톨릭대, 서강대, 광운대 등에서 강사와 교수로 강단에 오를 때마다 김 동문은 수강생 카드를 만들어 제자들의 얼굴까지 익혔다. 수강생에게 신상명세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본인의 이력서를 나눠준다는 김 동문은 “학생이 있어야 학교가 존재하고, 학생을 존중해야 교수가 존경 받죠”라고 말했다.
학창 시절 서강방송국(SGBS) 창단 멤버로 활동하며 벗들로부터 ‘방송국문과’냐 ‘국문방송과’냐는 핀잔도 들었다는 김 동문은 유난히 동문들에게 인기가 많다. KBS 동문회장을 세 차례나 역임했을 정도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 동문의 꼼꼼함은 종이 한 장 함부로 버리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 학창 시절 모교와 동문들과의 추억담을 들려 달라는 ‘서강옛집’의 주문에 김 동문이 주섬주섬 챙겨온 자료가 사례로 든 두 번째 장면(#2)을 포함해 한 움큼이다. 모두 수십 년 된 옛날 자료들이지만 어제 받은 듯 빳빳하다. 모교 언론대학원 1기로 입학할 때 참고했던 1992년도 안내 팸플릿도 펼친다. 이러한 꼼꼼함은 한국방송관계문헌 색인을 비롯해 방송 관련 저서 10여권을 펴내는 데 이르렀다. 김동문은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농사 일기를 쓰시던 것을 보면서 저절로 기록에 대한 습관이 든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방송 현업에서의 실력과 경영자로서의 능력과 함께 학문적인 성과까지 인정받아온 김 동문은 기획력, 친화력, 추진력 등을 두루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적자에 허덕이던 KBSi를 맡아 4개월 만에 흑자 전환시킨 이력을 포함해, 올해 2월부터 광운대 정보콘텐츠대학원장을 맡은 이후 6개월 만에 80억원 상당의 정부 지원을 이끌어낸 수완도 발휘했다.
일복 많고 다재다능한 김 동문의 소망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름답게 죽자’다. 김 동문은 “중국 명나라 말기 장호가 엮은 책 ‘학산당인보’에서 발견한 어구 ‘석가헌(夕佳軒)’의 뜻풀이처럼 ‘저녁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며 “품격 있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동문은 몇 해 전 김포의 전류리 포구에서 조금 더 들어간 곳에다 자그마한 서재를 마련했다. 움막같이 마땅하게 앉을 곳도 없는 황막한 서재다. 서재는 아호를 따서 송인재(松印齋)라 이름 붙였다. 이곳에서 평온한 주말이면 책과 더불어 저무는 해를 감상한다. 서재에 심훈의 ‘그날이 오면’, 정지용 시집 등 희귀 초판본 도서가 그득할 정도로 못 말리는 책 욕심을 보니 영락없는 국문학도다.
글·사진=정범석(96 국문) 기자
“미정아, 잘 있냐? 방학 안 끝났니?”
“어머, 교수님 안녕하세요.”
무더운 8월 어느 날, 신촌의 민속주점에서 모교 재학생과 마주친 김성호(67 국문) 동문은 아는 얼굴을 마주치자 대뜸 이름부터 부른다. 외부 강사로서 커뮤니케이션학부와 언론대학원에서 김 동문이 가르친 제자다. 동동주 안주로 나온 파전을 찢던 제자는 대선배이자 강사가 어떻게 자기 이름을 기억하는 지 의아해 하면서도 무척 반긴다.
#2
‘성호형 보시오’란 인사말로 써내려간 엽서는 이공규(68 경제) 동문이 학창 시절 부산으로 여행 갔을 때 부쳐왔다. 4원짜리 엽서의 발신일이 1969년 8월 5일이다. 아무 연락 없이 떠나온 것을 이해해달라며 서울에서 보자는 당부가 실렸다. 원용진(76 신방) 모교 신방과 교수는 1991년 미국 대학에서 박사 학위 논문을 완성하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왔다. 평소 김 동문으로부터 도움 받은 데 대한 감사 인사가 꾹꾹 담겼다.
1970년 한국방송공사(KBS)에 서강인 최초로 입사해 36년 6개월 동안 방송 한길을 걸어온 김성호 동문이 지난 6월 제 8대 한국소통학회장에 취임했다. 한국소통학회는 신문방송, 국어, 스피치 교육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하는 모임이다. KBS에 서 아나운서와 원주방송국장을 거쳐 기획단장과 KBSi 대표이사까지 거친 김 동문은 ‘소통’이 부족한 대한민국에 신선함을 불어넣을 태세다. 첫 대면하는 누구에게서라도 30분이면 호감을 살 정도로 소탈한 김 동문의 성품이 가져온 책임이자 명예다.
사례로 든 첫 번째 장면(#1)은 김 동문이 지닌 소통의 자세가 발휘된 성과다. 2000년 이후부터 서울대, 가톨릭대, 서강대, 광운대 등에서 강사와 교수로 강단에 오를 때마다 김 동문은 수강생 카드를 만들어 제자들의 얼굴까지 익혔다. 수강생에게 신상명세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본인의 이력서를 나눠준다는 김 동문은 “학생이 있어야 학교가 존재하고, 학생을 존중해야 교수가 존경 받죠”라고 말했다.
학창 시절 서강방송국(SGBS) 창단 멤버로 활동하며 벗들로부터 ‘방송국문과’냐 ‘국문방송과’냐는 핀잔도 들었다는 김 동문은 유난히 동문들에게 인기가 많다. KBS 동문회장을 세 차례나 역임했을 정도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 동문의 꼼꼼함은 종이 한 장 함부로 버리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 학창 시절 모교와 동문들과의 추억담을 들려 달라는 ‘서강옛집’의 주문에 김 동문이 주섬주섬 챙겨온 자료가 사례로 든 두 번째 장면(#2)을 포함해 한 움큼이다. 모두 수십 년 된 옛날 자료들이지만 어제 받은 듯 빳빳하다. 모교 언론대학원 1기로 입학할 때 참고했던 1992년도 안내 팸플릿도 펼친다. 이러한 꼼꼼함은 한국방송관계문헌 색인을 비롯해 방송 관련 저서 10여권을 펴내는 데 이르렀다. 김동문은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농사 일기를 쓰시던 것을 보면서 저절로 기록에 대한 습관이 든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방송 현업에서의 실력과 경영자로서의 능력과 함께 학문적인 성과까지 인정받아온 김 동문은 기획력, 친화력, 추진력 등을 두루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적자에 허덕이던 KBSi를 맡아 4개월 만에 흑자 전환시킨 이력을 포함해, 올해 2월부터 광운대 정보콘텐츠대학원장을 맡은 이후 6개월 만에 80억원 상당의 정부 지원을 이끌어낸 수완도 발휘했다.
일복 많고 다재다능한 김 동문의 소망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름답게 죽자’다. 김 동문은 “중국 명나라 말기 장호가 엮은 책 ‘학산당인보’에서 발견한 어구 ‘석가헌(夕佳軒)’의 뜻풀이처럼 ‘저녁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며 “품격 있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동문은 몇 해 전 김포의 전류리 포구에서 조금 더 들어간 곳에다 자그마한 서재를 마련했다. 움막같이 마땅하게 앉을 곳도 없는 황막한 서재다. 서재는 아호를 따서 송인재(松印齋)라 이름 붙였다. 이곳에서 평온한 주말이면 책과 더불어 저무는 해를 감상한다. 서재에 심훈의 ‘그날이 오면’, 정지용 시집 등 희귀 초판본 도서가 그득할 정도로 못 말리는 책 욕심을 보니 영락없는 국문학도다.
글·사진=정범석(96 국문)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