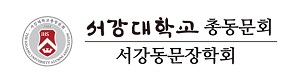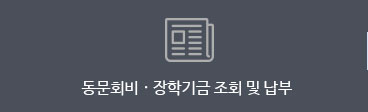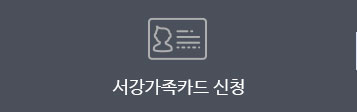[김기홍(00 국문) 작가] “무거운 입, 큰 귀 가진 작가의 세상 탐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선비 작성일10-06-06 02:07 조회15,82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문학동네 소설상 수상
김기홍(00 국문) 작가
“무거운 입, 큰 귀 가진 작가의 세상 탐구”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한 작가는 지치지 않고 꾸준히 글을 쓸 수 있는 뚝심을 ‘엉덩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2009년 제 15회 문학동네 작가상을 받으면서 문단에 나온 김기홍(00 국문) 동문은 무거운 입과 큰 귀를 가진 젊은 작가다. 인터뷰 내내 시종일관 차분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대답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현재 한국 문학계에는 1980년대에 출생한 젊은 작가들이 속속 등단하고 있으며, 평자들은 그들의 작품을 관통하는 공통된 시대의식을 발견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가볍다’나 ‘새롭다’처럼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천편일률적인 수식어를 붙이기도 한다. 김 동문의 장편소설 「피리부는 사나이」(문학동네, 2009)는 세대를 생물학적인 출생연도로 구분하려는 이들을 머쓱하게 만든다.
2004년에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들이 무한한 지식의 미로인 도서관에서 성장하는 초반부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소설 속의 청년들은 무척 지적인 대화를 나눈다. 문학과 철학의 닮음과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제도로서의 학문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도 한다. 특히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주어진 제도와 관습 안에서 ‘학습’된 행위가 아닌지 묻는다. 김 동문은 인물들의 이러한 고민이 곧 작가자신의 고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작가로서 독자들과 작품을 통해 소통하고 싶다는 열망을 누구 못지않게 품고 있다.
“시골에 계신 분들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을 쓰고 싶다는 열망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 작품을 세상에 내어놓고 작가로서 첫 걸음을 뗀 입장에서 독자들의 반응도 궁금해 할 법 한데, 그는 사뭇 의연해보였다.
“독자들의 반응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 손을 떠난 문제니까요.”
그는 그러면서도 독자들이 익숙한 문화적 코드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작품을 자유롭게, 독창적으로 읽어주기를 기대하는 듯 보였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피리 부는 사나이’ 이야기를 모티프로 삼아 타인에 대한 사랑, 타인의 부재로 인한 고통과 각성, 세계 악에 대한 각성을 소설로 표현해낸 작가의 공력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김 동문은 “서강에서 국문학과 철학을 복수 전공하며 ‘세상을 읽는 법’을배웠다”고 말했다. 각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그는 여러 수업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고, 특히 복학 이후 지식에 대한 깊은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그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즐겨 감상하면서 예술의 아름다움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오는지 미학적인 질문들을 탐구하는 중이다.
문학이 언어예술로서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을 고민하는 작가의 독서 목록에 보르헤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 김 동문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나 토마스 핀천 등 문학의 전통 형식을 쇄신하면서 동시에 아우르는 작가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한국어로 글을 쓰지만 한국어 바깥에 있는 ‘다른’ 문학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자신의 작품이 건강한 차이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예술의 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고민한다. 그의 인물들이 사소한 것과 사소하지 않은 것,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않은 것을 뒤섞어 고민하듯이 말이다. 최근 청년들의 현실은 출구 없는 통로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자신의 세대를 단순하게 규정하는 것을 망설이면서도,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경제적인 경쟁적 압박이 큰 것 같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면 소설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김 동문에게 소설 쓰기는 지금 당장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하지는 않는 언어적 긴장의 방식인 셈이다.
그는 누군가와 인터뷰를 하고 나면 ‘왜 이 말은 안 했을까, 왜 이 말은 했을까’ 고민한다고 했다. 주로 조용한 곳을 찾아가 글을 쓴다는 그에게 ‘하고 싶은말’과 ‘할 수 없는 말’의 갈등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글=허윤진(99 영문) 문학평론가
사진=김성중(01 신방)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