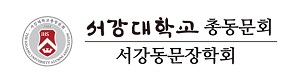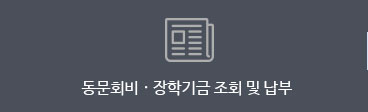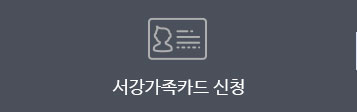[Brovo my life] 김성수(86 철학) 예술극장 나무와물 대표, 노고언덕 오르면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가온 작성일09-05-07 01:00 조회12,67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명함을 들여다 볼 때마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는 딱 맞는 수식어 하나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은 결코 아니다. 좌충우돌 되는 대로 살아온 것도 같지만 딱히 그렇지는 않다.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딘가로 가고 있는 모습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학시절 연극동아리 '몸짓' 창단
모교 철학과에 처음 원서를 내던 그날, 내가 연극을 하게 될 것이란 생각은 꿈에도 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서강연극반의 명성과 이근삼 선생님의 탁월한 강의에도 사실 별 관심이 없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메리홀도 별로 가 볼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재학 중에 등단해서 작가가 되고 싶었으나 문학반의 살벌한(?) 분위기 탓에 근처에도 못 가던 얼치기 문학 소년이었기에, 그저 대학이 가져다 준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다.
하지만, 1986년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못했다. 대학에서의 첫 한 달은 충격이었고, 애통이었으며, 배신과 절망이었다. 베트남 전쟁사를 처음 읽은 때를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공부하고 싶었던 ‘철학(哲學)’이 두 가지 얼굴을 지녔다는 사실을 깨달은 날이 기억 속에 생생하기만 하다. 그래서 펜 대신 돌과 화염병을 들었고, 아마 2학년 가을 어림까지‘투사의 삶이 어울린다’고 믿으며 살았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어떤 거대한 힘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힘은 내가 극을 쓰게 만들었다. 별 뜻 없이 교지에 투고했던 희곡에 이근삼 선생님이 남기신 날카로운 평은 나를 무대로 이끌었다.
1988년 여름, 총학생회 문화부에서 책임을 맡던 나는 연극학교를 방중 프로그램으로 제안했고, 여기에서 수업을 들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창작극회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명칭 때문에 서강 연극반과 부딪쳤지만, 서강 언덕에서 각자 자신들의 위치를 찾아 나갔다. 공연예술연구회 ‘몸짓’이 바로 그 동아리다. 지금 생각해도 낯 뜨거운 창단 공연과 ‘열정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함’을 깨닫게 했던 첫 워크숍 공연은 나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해준 전환점이었다. ‘몸짓’과 함께 할 때 서강언덕과 메리홀은 거대한 이불 속 같은 곳이었다. ‘몸짓’과 더불어 K관 지하에서, C관 동아리 방에서, 메리홀 무대 위에서 살았다. 11학기 만에 졸업한 다음에도 영혼의 반은 메리홀이나 C관 2층에서 떠돌고 있었다. 그 ‘몸짓’은 연출가 홍주영, 영화감독 전계수, 탁월한 배우 백현주, 조희봉, 극작가 동이향 동문을 만들어 냈고 여전히 작품을 만들고 있다.
어머니 자궁처럼 안온한 곳, 메리홀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 생활을 접고 6년 간 학원 선생을 했다. 그래서 돈은 벌었을 지도 모르나 밤마다 우울증으로 영혼이 쇠잔해졌다. 그 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매섭게 가르쳐 준 곳은 바로 ‘몸짓’과, 어머니 자궁 같던 메리홀이었다. 1998년 몸짓 10주년 기념 공연으로 자작 락 뮤지컬을 연출할 때는,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아침 수업을 마치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자유로를 탄환처럼 내달려 모교 강의실에서 연습을 하고, 다시 자유로를 내달려 일산에 가서 수업하는 생활을 2달 가까이 하면서 행복했다. 그러다 그 행복을 찾아 다시 길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사실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쯤인지 잘 모른다. 운영하고 있는 소극장이 두 개나 되지만(예술극장 나무와물, 바다씨어터) 둘 다 사정이 어렵다. 여전히 생계를 걱정할 만큼 집도 절도 없이 위태하다. 하지만 좁고 험한 이 길이 나쁘지 않다. 아직은 어디론가 가야 할 때인 것 같고, 언젠가 처럼 전환점인지도 모른다. 그래도 그다지 불안하지 않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노고 언덕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거기 해답이 있을 테니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