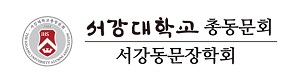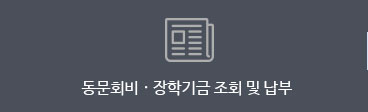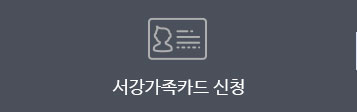화제의 인물- KBS '라디오 정보센터' 진행하는 박에스더(89.정외) KBS 사회부 기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24 14:30 조회19,23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여기자' 고정관념 깼으니 최고의 인터뷰어로 만나뵙겠습니다
KBS '라디오 정보센터' 진행하는 박에스더(89.정외) KBS 사회부 기자
박에스더(89.정외) 동문의 이름이 '박에스'나 '박스더'였다면 어땠을까? 반듯하게 칼로 자른 듯한 세 글자 이름을 가졌다면 지금의 박 동문은 없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덧니 같은 마지막 글자에는 묘한 재능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보는 눈이다. 입사 초 '새로 나온 화장품이 유행'이라는 아이템도 '큰 효과가 없는 상술 화장품'이라고 바로 고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박에스더스러운' 모습이다.
1980년대 학생 운동의 끝자락에 청년 광장을 누비며 '정치학 개론'을 논했던 박 동문. 이제 전 국민을 상대로 정치와 경제를 논하는 KBS 제 1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라디오 정보센터'(월~금, 낮 12:20~2:00)의 진행자로 2년 동안 마이크를 잡고 있다. 또 1997년 KBS 기자로 입사, '악바리' 여기자라 불리며 펜과 수첩을 든 지도 9년이 흘렀다.
● "진행자 박에스더입니다" VS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박 동문에 대한 진실 한 가지. 인터넷에 '박에스더'를 검색해보니 박 동문에 대한 정보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라디오 정보센터'에 누가 출연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줄을 잇는다.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반응이 상당했다. 어쨌든 박 동문도 '준 공인'이라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박 동문은 "아니에요"라며 고개를 가로젓는다.
"프로그램 자체가 생방송이고 워낙 유명한 프로그램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부담되고 조심스러운 것도 있죠. 혹시나 내가 하는 말이 편파적인 발언이거나 사담(私談)은 아닐까 노심초사한답니다."
-부담이라면 어떤 부담을 말하는 건가요?
"정치인부터 장관, 경제인 등 유명인들이 인터뷰를 하는 자리이니 만큼 짧은 시간도 헛되이 보내면 안 된다는 부담이죠.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가 라디오 진행을 하려고 하니 처음엔 적응도 못 했답니다. 소위 말하는 '기 싸움'에서지지 않으려 애도 많이 썼고 여러 가지 시도도 많이 해봤어요."
─ 연습이나 시도를 통해 터득한 것이라도 있나요?
“맨 처음은 일단 듣기만 했어요. 인터뷰는 인터뷰 대상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하고 거기서 계속 질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제 방송을 모니터했고 다른 방송 시사 프로그램도 듣고… 듣는데만 6개월이 걸렸어요. 그 이후 들으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여유를 가졌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도 하고 내 생각도 정리하고. 마지막 단계는? 바로‘장악’이죠. 준비된 질문이 없어도 듣기만 하면 인터뷰 속도 조절까지 할 수 있는 단계죠.”
─ 가장 기억에 남는 출연자가 있다면요?
“음… (한참을 생각한 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요. 정말 몇 번의 시도 끝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그게 마지막이 됐죠. 지금 현재는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을 인터뷰 해보고 싶어요.”
─ 아. 쉽지가 않을 텐데….
“그래서 하는 거죠. 하하. 지금까지 어떤 곳에서도 인터뷰를 하지 못한 사람이라 욕심도 나고요. 앞으로 정치 할 의향이 있는지 대답할 때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죠. 이럴 땐 ‘박에스더 기자’로 돌변해야죠.”
● 서른 다섯 박씨 아줌마
인터뷰 내내 적당히 빠른 말투, 동그란 눈동자, 또랑또랑한 목소리… 꼬들꼬들한 밥 같았다. 박 동문이 말한 ‘기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이미 그는 취재 기자의 머리 위에 올라간 듯 했다. 기자 생활 9년 경력, 시사 프로그램 진행 2년 노하우의 복합 긴장쇼를 만들고 있었다.
“거칠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전제 스스로 한계를 갖지 않으려면 강하고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통적으로 여성을 가두려했던 한국 사회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전 어떤 여성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 일은 여자라서 좀…’이라는 말 들으면 화가 났어요.”
─ 그래서 KBS 최초의 법조팀 여기자가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강한모습은 그럼 의식적인 행동일 수도 있겠네요?
“입사 초기에는 그랬죠. 일부러 지저분하게 다니고 쓰레기통 뒤져서 사건 단서 찾고… 그런 ‘여성의 전형성’을 깨고 나니 주위 사람들도 인정해 주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종군 취재도 제가 희망해서 갔죠. 어떤 일이든지 적극적으로나서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욕심도 많고 의욕도 많은 박 동문에게 인터뷰 말미 새해 목표를 물었다.
“아직 내 상태가 미완(未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무슨 프로그램을 맡겠다, 어떤 취재를 하겠다 등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공식적인 답도 내리지 못했어요. 그저 어디든 내가 맡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 그뿐이죠.”
박 동문은 스스로를 국밥집의 ‘주모’라고 얘기했다. 스스럼없이 아무에게나 가서 얘기 건네고 때로는 떼쓰기까지 하는 태도. 취재를 하든, 방송을 하든 오로지 ‘사람들’이 주인공이라는 박 동문의 얘기가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도 ‘기 싸움’에서 완승을 하나보다.
김범석(98·영문)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