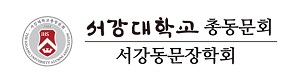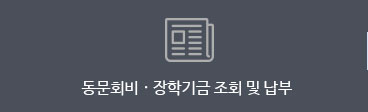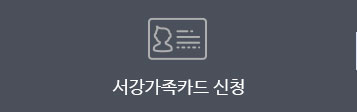다시 듣는 은사님 명강의⑩ 생명과학과 장 진 교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4-12 19:32 조회13,22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27세때 美프린스턴대학서 박사학위
실험실 설계·전기배선등 직접 챙겨
장진 선생님은 생명과학과(생물학과)를 만들다시피 한분이다. 아니, 초창기 서강대를 만든 주역 중 한 분이시다. 장진 선생님은 학생들로부터도 학계에서도 두루 존경받던 분이시다. 장진 선생님을 모시고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커다란 행운이 아닐 수 없다.
1954년, 27세의 나이로 미국 프린스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장진 선생님은 브라운대학에서 가르치셨고 미국국립보건원(NIH)에서 3년간 연구를 진행하셨다. 훔볼트재단의 초청으로 독일에 건너가 하이델베르크대학 등지에서도 수년간 연구를 진행하셨다. 생물학의 최첨단 분야에서 장진 선생님은 세계의 석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과학자였다.
장진 선생님이 귀국한 것은 1964년의 일이었다. 제2공화국 총리를 지낸 아버지 장면 박사가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데다 건강마저 좋지 않아, 장남의 자리를 지켜야 했다. 장진 선생님의 서강과의 긴 인연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개교한지 몇 년 되지 않은 대학의, 이제 갓 학과의 문을 연 생물학과에 부임한 장진 선생님은 서강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했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내셨다. 장진 선생님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하신다.
“서강은 예수회의 교육이념에 투철했습니다. 비록 작지만, 미국 수준의 이과교육을 할 수 있게 해 주었지요. 그래서 수준 높은 실험도 가능했던 거고요.”
그때 우리가 배운 것들은, 우리가 받은 실험 교육의 내용은, 지금 서울대에서 하고 있는 것에 견주어도 훨씬 나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실험의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그만큼 질적으로 충실했다는 것이다. 그때 선생님은 “너희들이 배우는 게 미국의 최일류는 못되더라도, 최소한 중상위권 이상의 교육은 받는 셈이다. 그 정도 수준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자부심을 갖게끔 해 주셨다. 미국에서 체득하신 것을 서강에서 그대로 실현하고자 하셨던 것이다.
모든 것이 부족한 시절,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절이었다. 그래서 장진 선생님에겐 방학이 없었다. 다음 학기 실험에 필요한 씨앗들, 실험기자재들을 준비하느라 늘 분주하셨기 때문이다.
“가난해서,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은 실험을 시키려면 미리미리 마련해 두는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장진 선생님은 넓게 공부할 것을 주문하셨다. 생물학과 학생들에게도 물리학의 여러 과목, 전기회로, 전기전파학 기초과목 등을 수강하도록 유도하시곤 했다. 장진 선생님은 “과학자가 실험기구를 다루려면 꼭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근래에 생물학은 옛날처럼 생물학만 해서는 안되게 됐다. 물리, 화학, 의학, 공학등에 대해 넓게 배워야하고 협동 연구도 반드시 필요하다. 장진 선생님은 그때 이미 그런 점을 강조하신 것이다.
선생님 스스로도 전기전자학에 해박하신 분이어서 전자공학과 교수님들이 놀라곤 하셨다.
“신경생물학이라는게 원래 그런 학문들과 연관이 있잖아요. 세포의 전기적 현상을 측정하려면 배우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60년대 후반에 세워진 서강의 과학관도 선생님의 이런 점들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건물이다. 선생님께서는 실험실 설계에서부터 전기배선 관련 사항들을 직접 챙기셨다. 실험기구를 그때그때 준비할 수 있도록 제작실을 만들게 하는 등, 과학관은 장진 선생님의 손이 안 간 곳이 없을 정도다.
선생님은 가끔 외국에 가시면 먼저 실험실을 찾으셨다.그곳에서 안 쓰는 실험 장비들, 기계들을모아 한국에 보내기 위해서였다. 하버드 메디컬스쿨의 신경생물학 관련 실험기구도 그때 들여오셨다. 한국에서 이 분야는 이때 비로소 시작됐다.
당시는 신경생물학을 알지도 못하던 시절이었다. 미국,독일 등지에서 장진 선생님은, 이제는 교과서에 나오는 과학자, 존슨, 헤이스팅스 등의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하셨다. 이 분야의 창시자 가운데 한 분이셨던 것이다. 장진 선생님께서는 신경생물학회를 조직하고 회장을 맡으면서 국내의 연구를 외국에 알리는 일에도 정력을 쏟으셨다. 학회지에 소개될 논문을 일일이 고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그때부터선생님께서 개척하신 이 분야는 현재 생물학 연구의 최전선에 해당한다. 정부와 기업체들이 많은 연구비를 지출하는 인지과학, 뇌 연구 등이 바로 그것이다.
장진 선생님은 초기 서강의 교육이념을 온 몸으로 보여 주신 분이다. 전문지식에 앞서 과학자의 기본 소양을 닦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여긴 선생님의 생각은 보편적 교양교육을 추구한 서강의 정신과 그대로 포개진다. “학부 단계에서는 넓게 가르쳐야 훗날 독립적인 연구를 제대로 할 연구자를 기를 수 있다”고 하신선생님의 말씀은 학제간 연구와 단과대학간의 단절을 극복하고자 하는 오늘날의 대학사회에서 새삼 경청해야 할 점이다.
임정빈(66·생명) 서울대생명과학부 교수
퇴근 잊고 실험 지도‘생명과학도의 전설’
내가 본 장진 선생님
천년의 고도 경주에 똬리를 튼 지 9년, 눈이 거의 없는 경주에 그것도 3월에 처음으로 폭설이 내리던 날 ‘서강옛집’의 기자로부터 받은 한 통의 전화는 70년도 3월 초순경 갑작스레 퍼붓던 함박눈을 맞으며 서강 언덕을 오르던 신입생 시절의 기억들을 떠오르게 했다. 잿빛의 암울했던 그 시절 서강은 나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으며 희망이었다. 그 중심에 나의 스승이신 장진 교수님이 계셨다.
내 인생에 그분이 초대되신 지 35년, 그분은 나에게 너무도 큰 모습으로 자리하고 계신다. 이제 50대 중반이 된 지금도 그분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게만 느껴진다. 지금처럼 생명과학이 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던 때, 당신께서는 곧 생명과학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선택을 격려해 주셨다. 그분의 말씀은 옳았다. 지금 우리는 생명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젊은 시절 내가 내린 가장 멋진 결정은 서강과 생명과학을 선택하고, 그분을 스승으로 모셨던 것이었다.
생명과학자가 되기를 꿈꾸며 대학원을 진학했던 젊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미래 모습들을 벌써 그분에게서 보고 있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미국과 독일의 명문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하셨으며, 신경생리학 분야에서 당신의 이론을 가지고 계셨던 그분은 국내에 세계적인 생명과학자가 거의 전무하던 그 당시 우리들의 전설이셨다.
최신의 실험기자재와 완벽한 시설의 실험실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우리의 행운은 당신의 제자에 대한 사랑과 정성으로 당신께서 관계하시던 외국의 대학들과 지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얻어내시고, 일부의 기자재는 당신이 교내에 설립하신 기계, 전자공작실에서 직접 제작까지 하심으로써 이루어진 결과였다. 엄격하신 학문적 자세, 전문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 서강과 제자에 대한 당신의 깊은 사랑과 열정. 그것은 서강이 추구하던 정신이었으며 서강이 뿜어내던 싱그러운 향기였다.
내가 대학원 석사과정을 한 학기 마쳤을 때 그분이 미국에서 안식년을 마치시고 귀국하셨다. 얼마 후 나는 연구실로 찾아가 지도교수가 되어주실 것을 청하고 그분의 전문분야인 신경생리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한국 최초의 신경생리 연구실험실이 꾸려지는 순간이었다. 그분의 담당 과목 실험은 늘 밤 9시가 넘어서까지 진행되었고, 당신께서도 퇴근하시지 않고 우리의 실험을 지도해 주셨다.
그때 교수님의 실험조교이던 나는 실험진행과 실험동물들을 준비하느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두서없이 중얼거리기 일쑤였고 대소변도 못 가릴 정도로 거의 죽을 맛이었지만, 내가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었으며 학문에 임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던 시기였다. 그분의 연구실을 거쳐 간 많은 제자들은 지금도 그분을 조금이라도 본받으려 애쓰며 유수의 연구소와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다.
매년 초에 제자들이 모여 그분께 새해 세배를 드리려 구기동 자택을 찾는다. 그때마다 조금씩의 변화가 감지된다. 요즘은 건강을 많이 잃으셔서 걱정이다. 좀더 당신을 닮지 못함이 죄스러워 그분 몰래 머리를 바닥에 더 가까이 하면서 세배를 드리곤 한다. 휴강 한번 없을 정도로 건강하셨던 그분을 대학원생이었던 내가 처음으로 모시고 신촌의 한 선술집에 들어섰을 때의 그 짜릿했던 설렘은 아직도 나에게 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그분께 술 한 잔을 대접해드리고픈 내 마음을 조심스레 말씀드렸을 때, 당신께서 빙긋이 웃으시며 말씀하시길 “술은 성원이가 산다니까 안주는 내가 살께.”
대박이었다. 오랫동안 건강하신 모습으로“성원이”하고 불러주시길 원하는 것은 너무 큰 바램일까?
홍성원(70·생명) 동국대 생리학과 교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