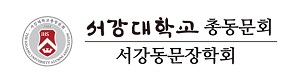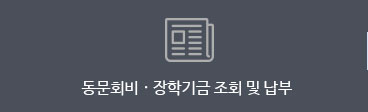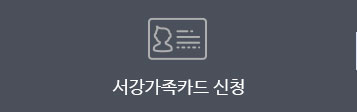양웅(85.국문) 한양사이버대 광고홍보과 교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4-08-11 14:08 조회16,06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광고는 예술의 이름 빌린 판매수단이죠”
칸 국제광고제 심사위원 130명 중 유일한 한국인
IMF이후 재치 넘치는 광고 보다 감성적 코드 선호
“카피라이터가 되기 이전에 회사원 될 각오해야”
“광고요? 한마디로 판매수단이죠.”
양웅(85.국문) 한양사이버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와 만나 자리에 앉자마자 이 질문부터 쏘아댔다. 광고계에서 15년간 몸 담았고 현재 관련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양 동문이 과연 ‘광고’라는 현대적 아이콘을 어떻게 정의내릴 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왠걸. 대답이 너무 싱거웠다.
그러나 양 동문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단, 광고는 다른 판매수단과 달리 예술의 이름을 빌린, 문화적․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판매수단이라는 점이 큰 차이점이죠.” 라며 광고에 대한 정의를 명쾌하게 마무리했다.
요즘 대학생들이야 광고 동아리 활동은 기본이고 광고 컨테스트 등을 통해 광고에 대한 열정을 불사르는게 일반적이지만 정작 본인은 학창시절 광고가 뭔지도 잘 몰랐다고 너스레를 떠는 양 동문. 그러나 알고보니 그는 이 바닥에서는 꽤 유명한 광고맨이다. 1989년 우리나라 3대 광고회사 중 한 곳인 금강기획에 카피라이터로 입사했고 이후 15년 동안 현업에 몸담으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광고 제작에 참여했다.
경력도 화려하다. 1995년 런던 국제광고제 파이널리스트에 오른 것을 비롯, 런던․클리오․뉴욕 국제 광고제 등 세계적으로 쟁쟁한 광고제에서 수상했고 지난달 열린 ‘51회 칸 국제광고제’에서는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회사 재직 시절 공부도 틈틈히 해 광고학 석사(고려대) 및 박사(서강대) 과정을 마쳤고 지난 봄 금강기획을 퇴사, 이제는 후학양성의 길에 여념이 없다.
“제가 입사할 당시만 해도 재기 넘치고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광고가 유행이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국가적 시련과 불황기를 거치고 나니 이제는 감성적 코드로 다가가는 광고가 전반적으로 눈에 띕니다. 이런 경향은 비단 경기와 관련짓지 않더라도 세계 광고계 추세죠. 하지만 이런 면에서 보면 한국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한국의 광고시장 규모는 총액 기준으로 세계 시장 10위 안에 들고 국민총생산의 1% 이상이 광고비를 차지할 정도로 양적 팽창에 있어서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질적으로는 이제 막 어린아이가 눈을 뜬 단계라고나 할까요.”
최근 한국 광고 동향에 대한 양 동문의 일침이었다. 먹고살기가 빠듯하면 정감 어린 휴머니티를 표현하고, 풍요로워지면 순간적 웃음을 주는 광고가 늘어나는 것이야 상식적이지만 그동안 한국 광고계는 광고가 상품의 판매수단이라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 광고의 사회적 메세지 전달이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써의 역할에 너무 소홀했다는 지적일 테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칸 광고제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것도 실은 양적 성장에 대한 의례적 대우에 불과합니다. 130여명의 심사위원 중 한국인은 딱 한 명뿐이었고 출품작 5,100여편 중 한국 광고는 1%인 50편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수상작은 한 편도 없었고 수상 후보인 쇼트리스트(Short List)에 딱 한 편 오른 것이 전부죠. 이게 바로 세계가 한국 광고를 바라보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광고가 지향해야 될 방향은 뭘까. 양 동문은 제일제당의 ‘다시다’ 와 오리온의 ‘초코파이’ 광고를 성공적 사례로 제시했다. 수십 년 동안 김혜자씨가 한결같이 “음... 이 맛이야”하고 외치는 다시다 광고나 어린아이를 비롯해 학생, 어른, 노인 등이 눈물을 글썽인 후 “정 精 오리온 초코파이”라는 카피가 뜨는 초코파이의 광고가 그 어떤 제품 광고보다 광고가 지닌 ‘문화적,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양 동문의 평가다.
장수CF는 문화적 기능 담겨
“모든 기업이 이런 캠페인 광고를 지향해야 제품이 인격체로 격상하고 결국에는 기업이 제품에 기대하는 사회적 파급력을 얻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죠. 휴대폰 광고의 경우 SK 스카이는 기능적 면을 알리는, 광고의 전통적 문법에 충실한 광고인 반면 삼성 애니콜은 그냥 이효리가 나와 춤만 추다 끝납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머릿속에는 스카이보다 애니콜을 기억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는 덧붙여 이런 방향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광고주나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이 먼저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흔히 광고주와 광고인들은 같은 컨셉으로 한 광고를 만들다 보면 지겹다는 느낌에 자꾸 다른 아이디어를 원하게 되는데 중요한 점은 정작 광고를 봐주는 시청자들은 같은 컨셉을 반복해도 전혀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광고주·광고인 조급증 버려야
그동안 카피라이터로서 이름을 떨친 그에게 자신이 쓴 대표적 카피가 뭔지를 물었다. 그의 대답은 “없다”였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참 난감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카피는 예술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예술 작품에는 모두 창조자의 이름이 붙지만 카피는 익명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리고‘이 광고는 내 작품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오만입니다. 광고는 카피라이터뿐 아니라 디자이너, 프로듀서, A E 등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것이지, 내가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
이런 겸손함을 인터뷰 내내 내비쳤지만 나중에는 주로 현대 멀티캡, 현대 걸리버, KCC 기업광고 등의 제작에 참여했다고 살짝 귀뜸해줬다. 학창 시절은 어땠을까. 대답은 여타 질문들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평범했다. 공부하고 놀고 하고 싶은 것 했다는 정도.
“제가 졸업할 당시(89년 졸업)만 해도 우리 과에서 광고나 방송, 언론계 쪽으로 시험 보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보통 교사가 되거나 출판사에서 일을 했죠. 그런데 전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당시 시사상식이나 국어 등의 필기시험을 치르는 대기업이나 방송사 입사는 힘들었습니다. 반면에 광고회사가 카피라이터를 뽑는 과정은 광고 문구 작성과 간단한 영어 인터뷰였습니다. 평소 글쓰기를 공부보다 좋아한 저로서는 광고문구 쓰는 게 어렵지 않았고, 영어 인터뷰 역시 당시 서강대가 자랑하는 영어 커뮤니케이션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카피라이터가 됐습니다."
인터뷰를 마칠 즈음 마지막으로 카피라이터를 동경하는 수많은 후배들에게 충고 한마디 부탁했다. 돌아온 대답은 “카피라이터가 되기 이전에 한 명의 회사원이 될 각오를 해라"라는 것.
“주위에 광고하고 싶다는 후배들보면 본인이 무슨 예술가가 되는 줄 착각합니다. 카피는 아까도 말했듯 예술이 아니기 때문에 카피라이터도 예술가가 아닙니다. 때문에 먼저 자신이 조직생활에 어울리는 성격과 자질을 가졌는지 생각한 다음에 약간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게 순리입니다. 무조건 예술이랍시고 광고에 달려든다면 낭패보기 쉽다는 말입니다."
문주영(95·국문, 경향신문 전국부 시청팀 · 본보 편집위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