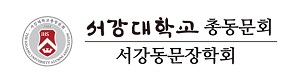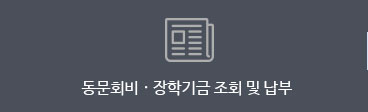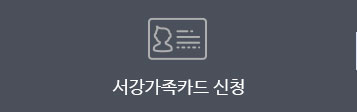영화평론가 심영섭(85.생명)의 영화 이야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03-03-28 11:03 조회21,54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인터뷰] “심리학·영화 둘 다 놓칠 수 없었죠”
2003/03/28(한국일보)
“제가 포수였는데, 거기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심리학을 전공한 독특한 경력과 정신분석학을 원용한 글쓰기로 널리 알려진 영화평론가 심영섭(37)씨는 대학 시절 야구반 포수였다. “첫 사랑의 남자가 투수여서 그랬는지, 나는 무의식적으로 포수라는 자리를 골랐죠.”
그의 새 책 ‘심영섭의 시네마 사이콜로지’는 ‘포수’처럼 온갖 심리학적 궁금증을 영화라는 장갑으로 모두 받아내고 있다.
심씨는 이 책에서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일까’를 가장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상식을 벗어나기도 하고, 상식과 틈이 벌어지기도 하는 오묘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 풀어 준다. 코믹한 삽화를 듬뿍 곁들였고 문체도 쉽고 재미있다. “화장실에 앉아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이었죠. 심리학 하면 어려워 하는데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서고 싶었죠.”
영화는 동네 비디오 대여점에서 빌릴 수 있는 것들로 고르고 환자들의 실례를 더해 토막 살인(‘텔미 썸딩’)부터 자살(‘박하사탕’), 외도(‘데미지’), 관음증(‘트루먼 쇼’) 등 다양한 심리학적 주제를 설명했다.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영화를 택했어요. 너무 오래되거나 희귀한 영화는 뺐어요. 가령 남자들이 새로운 것만 밝힌다는 ‘쿨리지 효과’를 설명할 때 ‘썸원 라이크 유’ 같은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를 선택해 새로운 각도로 읽어보려 했어요.”
그가 처음부터 영화평론에 뜻을 둔 것은 아니었다. 서강대 생명공학과에 다닐 때만 해도 동물행동학에 매료된 평범한 학생이었다. ‘관심이 자연에서 인간으로 바뀌어’ 고려대 대학원에 입학, 심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그리고 “어느날 영화가 말을 걸어와, 물 흐르듯” 영화평론가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
그리고는 1998년 ‘상금에 눈이 어두워’ 응모해 ‘시네21’ 평론가상에 뽑혔다. 그래서 김수지라는 본명 대신 ‘심리학과 영화를 두루 섭렵한다’는 뜻의 심영섭이란 필명으로 본격적으로 영화평론에 달려들었다.
“심리학이란 아버지와 영화라는 어머니를 두고 살기로 한 거죠. 이런 남성적 이름을 통해 내 안의 적극적 기운을 불러내고 싶었어요.”
그의 표현을 빌자면 이 책은 ‘심리학이라는 조강지처와 영화라는 애인을 동시에 좋아한 삼각관계의 결과물’이다. 가족도 영화에 흠뻑 빠져 있다.
아홉 살 난 아들이 영화감독이 되어 주었으면 하고 카메라를 선물로 안겨주고 영화 ‘오아시스’를 보여 줄 정도다. 부군 남완석(40) 교수도 우석대에서 영화를 가르치고 있다. 심씨는 이 책을 그레이스 켈리를 좋아하는 아버지에게 헌정했다.
강의를 하러 서울에 올라 왔다가 부산으로 내려가 영화 소개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대전으로 돌아가 두 아이를 키우며 산다. 영화와 심리학의 ‘두집 살림’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